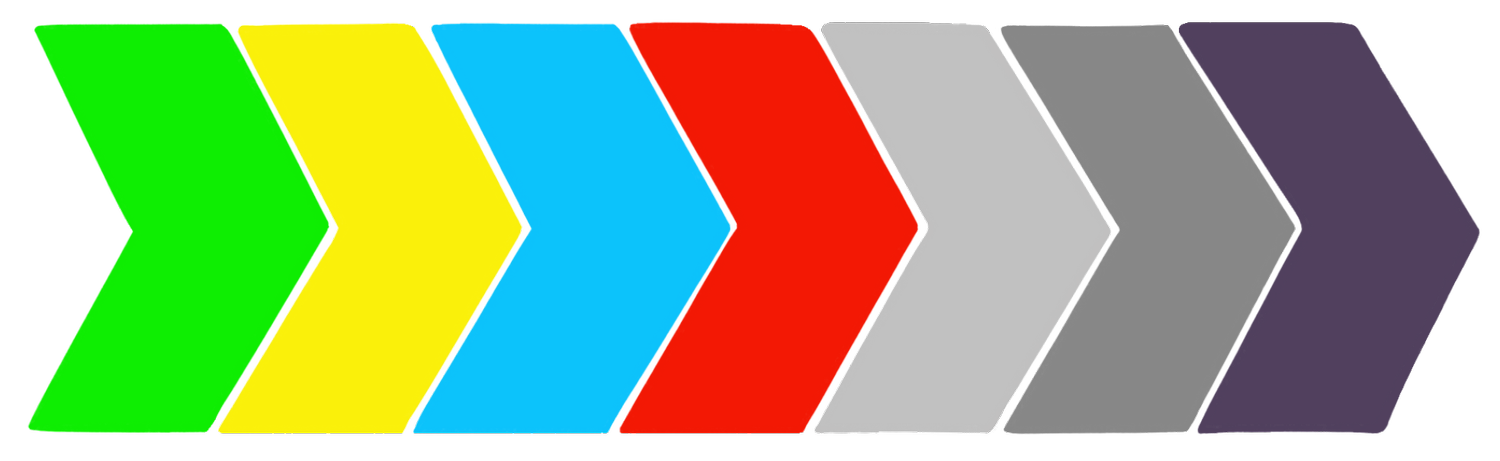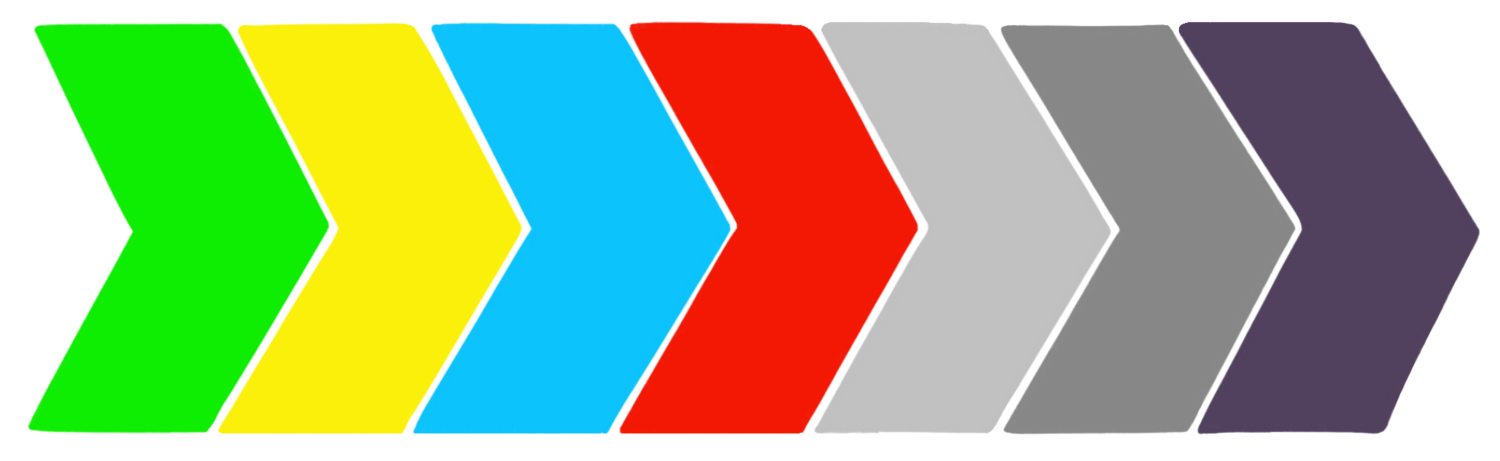Kim Seungwoo: "Even though I’ve imagined and prepared for this film for so long time, I was both excited and frightened at the beginning of the shooting"
IFFRCLAPPER: As directorial debut films go, BRING ME HOME is nothing short of a phenomenal feature. Where did the process of making this feature as your first film begin?
KIM SEUNGWOO: I’ve once seen a poster looking for a missing child a long time ago. I felt guilty and shame for myself being ignorant about others’ agony. I found it was also a dangerous approach to be just a bystander, being sentimental with others’ suffering, and determined to make a story about this. I wanted to tell a story about the terrible results we might cause being indifferent to others, but also wanted to tell about our sublime struggles and hope for life despite all the difficulties.
데뷔작으로서 <나를 찾아줘>는 매우 훌륭한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을 첫번째 장편으로 만들게 되신 그 출발점은 어디였나요?
오래전 길을 걷다 아이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그저 타인의 안된 일이라 생각하며 지나치는 제 모습에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동정하며 감상하는 방관자적 무관심 역시 위험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무관심들이 계속 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파국을 그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하는 희망과 숭고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Not only do you direct this feature, but you also wrote the screenplay – which process did you prefer on this feature: writing or directing?
It was in 2008 when I first started to write the script, so it’s been 12 years already. I had to revise it for thousand times, which made me feel so lonely. Maybe this is why I could feel much relaxed and fun during the shooting. Even though there were tons of variables, it was so thrilling for me to visualize the story, working with the crew and actors. Although I could not easily choose one preferred process, as writing always makes me feel anxious and nervous, I’d say it was better to work in the field where the dynamic energy flows with numerous people to talk to.
이 작품에서 연출 뿐 아니라 각본도 직접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면서 각본과 연출 중 어떤 과정을 더 좋아하셨나요?
각본을 처음 쓴 게 2008년, 12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수정을 거쳤고요. 아주 외롭고도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영향 때문인지 연출을 할 때가 상대적으로 편하고 즐거웠습니다. 현장의 촬영이라는 것이 변수도 많고 힘든 과정이지만 배우와 스탭과 함께 의견을 모아가며 영상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 짜릿했습니다. 무엇이 더 좋았다 할 수는 없겠지만 글을 쓰는 과정은 언제나 외롭고 불안하기에 아무래도 이야기할 상대가 있고 역동적인 현장이 더 편하고 좋았습니다.
How was the atmosphere of the film for you as a first time director on a feature film set?
Even though I’ve imagined and prepared for this film for so long time, I was both excited and frightened at the beginning of the shooting. As it was not only a return of the famous actress Lee Young-ae after 14 years but also a long-waited aspiration of mine, I felt strong responsibility.
However, I could let go of my greed and get through the times with my actors and staffs discussing every point of the movie with them. Within a limited budget and schedule, what I discovered was that the desire for showing too many things would rather ruin the film. So I’ve tried to concentrate on the main themes of my idea, and especially focus on the characters while directing.
In this regard, I think this was a film which followed my own ground rules of filmmaking which I’ve tried to keep. Of course I indeed wished if there was a bit larger budget and more time. I believe every filmmaker would have the same regrets.
첫번째 장편 연출이었는데, 첫 작품으로써 이 영화의 느낌은 어땠나요?
오랜 시간 머리 속으로 상상하고 준비했던 영화였지만 실제로 셋팅이 되고 났을때는 흥분과 함께 두려움 역시 느꼈습니다. 이영애라는 한국에서의 유명한 배우의 14년만의 복귀작이기도 했고 저 역시 오랜 시간 준비한 작품이다 보니 작품에 대한 책임감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배우와 스탭들과 함께 영화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나가며 욕심은 버리고 책임을 나눠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예산과 스케쥴 안에서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려는 욕심이 어쩌면 작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었던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자는 생각을 하였고 인물에 집중해서 연출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지키고 전달하고자 했던 원칙에는 충실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더 있었다면? 스케쥴을 조금만 더 확보할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요. 그런 고민과 후회는 모든 감독님들이 하겠지요^^.
South Korean contemporary BONG Joon-ho was rewarded with the highest cinematic honour last year with a best picture win for PARASITE. What do you think gravitates Eastern audiences to Korean cinema?
First of all, I think the cultural dynamic in this country made this possible. Thanks to high-developed IT infra, people could actively and enthusiastically express their own idea, and the creators really get influenced by their feedback. This could be a double-bladed sword for the artists who have to keep their own identity, but it is also a critical signal for a change for them who also need to get the public attention and affection.
In fact, I’m also curious about last year’s syndrome and want to know the reason as well. Wish you could let me know the reason, as I also want to be a famous director as Bong and show my film to a larger audience.
지난해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으로 영화계의 최고 영예를 누렸습니다. 한국 영화가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단편적으로 느끼는 이유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적 역동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IT기술의 발달로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제시하고 창작자들 역시 그들의 피드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해야하는 창착자, 예술가들에게는 양날의 칼과 같지만 관객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하는 대중문화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변화해야 하는 신호를 주는 무시할 수 없는 지점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솔직히 사실 저 역시도 궁금하고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기자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봉준호 감독님처럼 유명해져서 더 많은 분들에게 제 영화를 보여주고 싶거든요.^^
Was it challenging to direct a strong group of diverse actors and actress?
Of course, it was so challenging to lead all the actors to one direction, who has every different color of their characters. We’ve rehearsed two months before the shooting. I’ve also tried to pick the best location so that actors could be inspired at the field and live as the characters.
I’ve also tried to balance between the actors’ autonomy of emotion and the film’s tone and manner.
Thanks to the talented actors, we could find genuine characters inside them together by adjusting to each other.
서로 다른 여러 배우들에게 디렉팅을 하는 것이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각자의 개성이 다른 배우들을 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거니까요. 촬영 두달 전부터 리허설도 하고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배우들이 현장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고 그들로 살아갈 수 있게 촬영 장소지 선택에도 고심을 많이 했고요.
현장에서는 배우들이 느끼는 감정의 자율성과 영화적 톤 앤 매너의 적절한 균형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요.
워낙 좋은 탤런트를 가진 배우들이었기에 함께 조율해가며 조금씩 진짜를 찾아갔습니다.
Lead actress Yeong-ae Lee is nothing short of breathtaking as Jungyeon. How much did the actress bring to the role that you didn't already have on paper?
Every moment she brought to the role much more than what was written in the script. Not only in the emotionally explosive scenes, she always kept the balance of emotions in the calm or casual scenes.
Like any other directors, in case of BRING ME HOME, as it requests a broad emotional amplitude of actors, I could not reach my help to the very point of acting the emotions. I just tried my best to make the best condition for actors to concentrate and help them to get inspired. In that circumstance, Lee Young-ae really showed us a great immersion and capability.
When we were shooting the intense moment at the pier or the emotional last scene at mudflat, I was truly touched by the act as well. It was so fascinating to watch the moment that what I’ve always imagined finally turned into the vision, which was even greater than my imagination. I’m sure I can never forget those feelings until my last day.
주연배우 이영애씨는 극중 ‘정연’역으로써 아주 훌륭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준비된 각본 이상으로 배우가 역량을 발휘한 부분들이 있었나요?
이영애 배우의 경우 매순간 각본 이상의 연기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감정을 폭발하는 씬들은 물론이고 담담한 일상적인 연기를 할때도 감정의 균형을 잘 잡아주었지요.
다른 영화들도 그렇겠지만 나를 찾아줘의 경우 배우의 감정의 진폭이 너무도 깊은 영화라 감독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지점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우가 몰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환경을 만들어주고 영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영애 배우는 정말 놀라운 집중력과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방파제에서의 충격적인 장면이나 마지막 갯벌에서의 감정씬등은 저 역시도 현장에서 모니터를 통해 보면서도 감동했던 장면들이었습니다. 상상했던 것이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표현되는 장면을 촬영 현장에서 목격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마 죽을 때 까지도 이 순간을 잊을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You put the audience through quite the journey with BRING ME HOME. How important was it for you to showcase how dark this world can be?
At the early stage of plotting, the very first image of a film was a ray of light shining into the dark. A mother who finally gets pouring sunshine at mudflat after getting through the deepest darkness. That was the first image of BRING ME HOME. As this film has started from this image and tone, it might have tormented the audience a bit.
Also in regards to the themes, I wanted to talk about the sublime hopes that we should not give up even in the hopeless moments. While looking back ourselves through the dead-end we’ve caused by personal greed, individualism for one’s own hand and trivial indifferences, I wished we could try to find out the light of hope altogether, for a better world. This idea might lead the film look somewhat dark.
But I also had no clue that Jung-yeon’s journey would be this hard.
<나를 찾아줘>를 통해 세상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것 또한 감독님이 의도한 중요한 이 영화의 주요 주제인가요?얼마나 비중을 두셨나요?
맨 처음 이 영화를 구상할 때 처음으로 들어선 이미지가 어둠 속의 한줄기 빛이었습니다. 깊은 어둠을 지나 마지막 갯벌에서 쏟아지는 햇살을 받는 어머니. 그것이 이 영화의 최초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런 느낌과 이미지에서 시작한 영화다 보니 관객들을 다소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주제적으로도 이 영화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깊은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숭고한 희망이었습니다. 개인의 욕심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와 사소한 무관심들이 만들어 낼 수 있는 파국을 통해 우리를 되돌아보면서도 더 나은 세상을 향해 어딘가에서 비추고 있는 희망의 빛을 함께 찾아 가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영화를 만들다보니 이렇게 되었네요.
하지만 저 역시도 정연의 여정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One particular scene involving a character on a pier makes for a devastating sequence when the audience are almost given exactly what they want, only for you to take it away. How much fun did you have to deny the audience what they want?
It was a critical scene to build the theme of this film. But it was also a painful scene to me as well. I wanted to make sure that this film was something to experience, not to just watch and appreciate at a distance. At the same time, I wanted to make the audience experience Jung-yeon’s agony and loss along with her, so I intentionally chose to shoot the scene on a real pier at night sea, not in the filming set. But this seems too shocking and painful consequentially.
In the theatre seeing the audience being shocked, I was a bit satisfied that my direction targeted the audience correctly, but also felt sorry for them at the same time. Even though I’ve directed that scene and watched it more than a thousand times, the scene still makes me feel painful, even just thinking of it does.
부두 씬에서, 이야기는 관객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듯하다가 일순간 그들을 큰 충격에 빠뜨립니다. 관객들이 원하는 바와 반대의 지점을 연출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재미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영화의 주제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장면이었지만 저 역시도 매우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한발 물러서 감상하듯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 이건 감상하는 영화가 아닌 체험하는 영화라는 것을 각인시킴과 동시에 정연의 아픔과 상실감을 체험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현실적으로 찍으려 세트도 아닌 실제 밤바다의 방파제에서 촬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충격적이고 아프게 연출된 것 같습니다.
극장에서 큰 충격에 빠지는 관객들을 보며 보여주려던 연출의 방향성이 정확히 작용한다는 것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함 마음도 들었습니다. 직접 연출을 하고 수백, 수천 번을 본 장면이지만 지금도 보는 것이 고통스럽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아픈 장면이기도 합니다.
The film brilliantly and effectively balances the brutality of humanity with a glimmer of hope to those of faith. How important was it to showcase both qualities?
It was all about that. These two aspects are exactly what I thought as the figure of life itself. Admitting the cruel nature of humanity for survival and hoping for a better world were what I’ve tried to tell through this film. So the practical balance between these two was the key.
Because of this, I didn’t think that people in the fishing town were the specific villains. I’ve worked thinking they are just ordinary people who were put in a slightly different position from us. Even if their normality could make the audience uncomfortable, I hoped the audience could find out their own reflection from the figures of fishing town.
Not as a mere appreciation, but as an experience of life, I hoped this movie could show the hope for the faith with each other, looking back on ourselves.
이 영화는 인간사회의 잔인함과 사람들 사이의 신뢰에 대한 희망을 균형있게 보여줍니다. 두 면모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나요?
보여주고자 했던 것의 모두 다. 라고 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생존을 위한 자기 본위의 잔인한 인간본성 역시 인정하면서도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했기에 이 부분의 현실적 균형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지금까지 낚시터의 사람들을 특별한 악인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장이 다른 우리와 같은 보통의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을 불편하게 할 지라도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 역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단순한 감상 보다는 체험하며 우리를 돌아보며 신뢰에 대한 희망을 균형있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를 원했습니다.
The issue of child abduction is quite integral to your film. Is this quite a prevalent issue in South Korea?
Child abduction or abuse was a frequent issue decades ago, but not now. Recently Korea has been rapidly developing, and the public security and the nation’s consciousness also have been advanced. But I’m not 100% sure that this would not happen for good. I can still find some news about child abduction or abuse.
이 영화에서 아동 유괴는 아주 중요한 소재입니다. 한국에서 일반적이고 자주 있는 이슈인가요?
아동 실종이나 유괴, 그리고 아동폭력이 과거에는 자주 발생했었던 일이나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최근 급속도록 선진화가 되었고 경찰의 치안과 국민들의 의식 수준 역시 급속도로 발전한 상태이지요. 하지만 이런 일이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아동폭력과 실종에 관한 뉴스들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You leave the film with the viewer watching Yeong-ae Lee's Jungyeon in a sequence that feels neither like reality or dreamlike but nevertheless in a state of peace, do you think a person like Jungyeon can ever find peace in the world?
I wished she could get peace just for a moment, even though this could only happen in the film. But I know this could not be possible in reality. So I think this scene could be the cruellest and heart-wrenching one.
If we are a bit more concerned about other people who are on the same side with Jung-yeon (not just the parents who have lost their child but everyone who needs help), I believe this could help them to get peace in their mind and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마지막 고아원 씬은 현실같지도, 꿈같지도 아닌 느낌이지만 그 속에서 ‘정연’은 평화로워 보입니다. 실제로 ‘정연’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이 삶 속에서 평화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영화에서만이라도, 아주 잠시만이라도 평화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럴 수 없겠지요. 그렇기에 어쩌면 아주 잔인하고 아픈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연’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아이를 잃은 부모님 뿐만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세상은 조금 더 살만해지고 그들 역시 조금 더 평화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BRING ME HOME is just the beginning of what looks to be an illustrious career, what do you have in mind next?
Thank you for saying that. While attending numer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I felt sorry for many audiences who were heart-broken by this film. Also, it is a difficult time for everyone in the world because of the COVID situation.
So I’m trying to make my new story a happier one which could heal their souls and support their lives
<나를 찾아줘>는 감독님 커리어의 훌륭한 시작입니다. 다음 번에는 어떤 작품을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한국과 여러 해외영화제에 참가해 영화를 보며 가슴 아파하는 많은 해외 관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인 모두가 힘든 시절이기도 하고요.
다음 작품은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힘든 관객들을 조금이나마 응원하고 아픈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
BRING ME HOME Na-reul cha-ja-jwo premiered at International Film Festival Rotterdam. Read CLAPPER’s review here